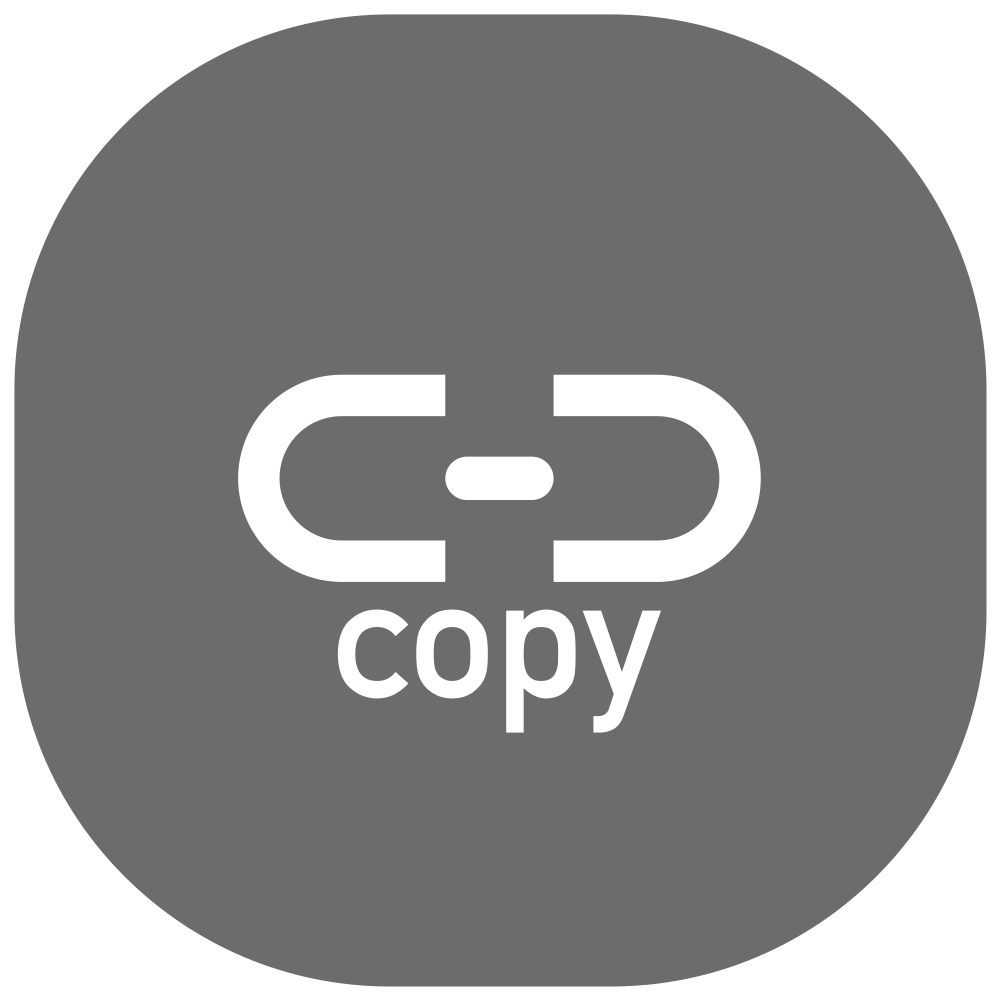▲ 출처: 픽사베이
2020년, 미국 NASA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 표면에 인간을 다시 보내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된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은 미국을 중심으로 10여 개국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우주 협력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문에는 “우주 자원의 활용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의 유엔 우주조약(1967)과 충돌한다. 우주조약은 “우주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며,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달은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대이다. 달에 풍부한 헬륨-3, 소행성에 존재하는 희귀 금속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자원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다.
NASA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소행성은 수십 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달의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중요한 원료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와 민간 우주 기업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아스트로포지 같은 기업들은 우주 자원 개발의 선두를 이끌며 ‘우주 채굴’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의 소유권과 이용권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자원의 소유는 아니지만 활용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표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의지’일 뿐이다. 비협정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자원에 접근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우주 공간은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국가와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BC Future는 “달을 점유하는 행위가 사실상 소유권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른바 ‘우주 식민주의’라는 말도 있다. 자원의 접근 불균형은 기술 불평등과 국제 정치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 자원의 상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 기준과 법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지금 이 순간도 몇몇 국가는 소행성 채굴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에 대한 국제 공조 체계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우주 자원의 공공성’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구에서처럼 개발과 이익, 환경과 평등이라는 질문은 우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달의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미래의 윤리와 공존을 시험하는 사회적 문제다.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 중요한 건 규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주 탐사는 계속되고 있다. 달과 소행성을 향해 뻗은 인류의 손끝이, 과연 모두를 위한 손길이 될 수 있을까. “우주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선언이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다.
참되고 바른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juuuu03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