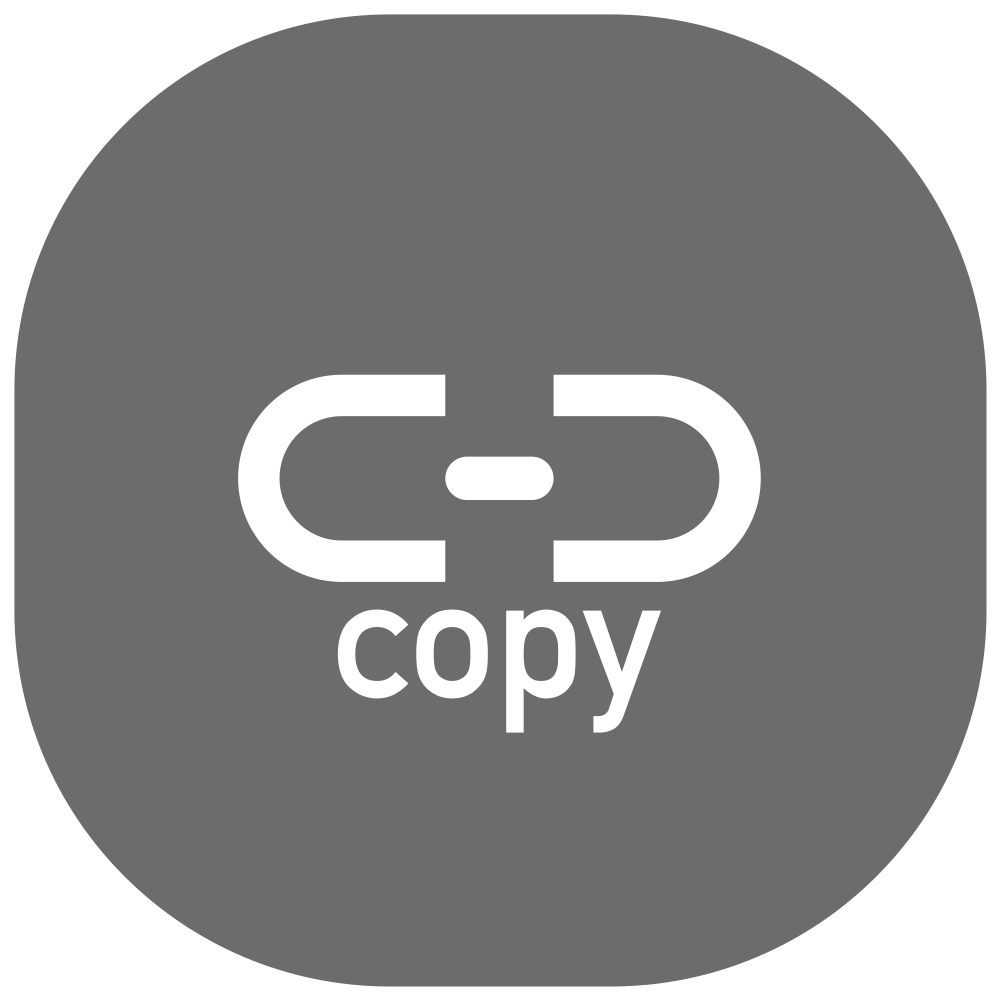▲ 출처: 픽사베이
물건을 사는 일이 곧 신념을 드러내는 시대이다. 비건 화장품, 중고 의류, 공정무역 커피, 제로웨이스트 샴푸 바까지, ‘착한 소비’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사고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곧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소비는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삶의 태도이자 신념의 표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 긍정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지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착한 소비’라는 이름 아래, 정말 모든 것이 착하기만 한 걸까?
윤리적 소비를 둘러싼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강조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상품을 ‘비건’이라 홍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한 의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좋은 일'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이용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윤리적 소비가 점점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자율적 선택이어야 할 윤리적 소비가, 점차 ‘해야 하는 것’, ‘실천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에코템’이나 ‘비건 인증사진’ 등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특정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의 소외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 착한 소비가 개인 간의 도덕 경쟁처럼 비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와 진정성은 희미해진다.
착한 소비가 항상 쉽고 편한 선택만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윤리적 소비는 종종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중고 거래를 위해 제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친환경 인증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비건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식당 탐색을 거듭하는 일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피로감을 느끼기 쉽고, 결국 실천을 중단하거나 처음의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소비의 가치가 무의미 한것은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모든 소비를 윤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 번의 선택이라도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변화는 타인을 향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과 가치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할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진다.
착한 소비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진다. 결국 우리가 소비를 통해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진정한 윤리적 소비의 의미가 시작될 것이다.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kmskmsmin19@gmail.com